연구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우리 밴드 KRIBBtonite가 첫 공연을 하였다. KRIBB + tonight(오늘밤)의 뜻도 있지만, 슈퍼맨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신비한 돌 kryptonite를 뜻하기도 한다. 준비 기간은 약 3개월. 각자 연구와 실험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모여 이런 성취를 이룬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들어 낸 음악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칭찬부터 하고 싶다.
 |
| 2025년 2월 4일, 역사가 이루어졌다. 정말 마음에 드는 단체 사진. 촬영자를 기억하지 못함이 아쉽다. |
 |
| 베이스를 치는 내 모습. 이를 보고 가수 이용복(1952~)을 떠올리는 분도 있었으나, 나는 존 윅 4편에 나오는 케인(견자단)의 모습과 대조해 보았다. |
멤버 중 한 명은 공연 후 정리를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자마자 부랴부랴 회의를 하려 세종시(과기정통부)로 달려갔다.
네 곡을 연주했던 공연 전체를 찍은 동영상을 입수하게 되어 밤 늦게 여기에 타이틀과 약간의 자막을 입혀 유튜브에 올렸다. OpenShot 비디오 에디터를 쓴 지가 좀 되어서 사용법을 기억해 내느라 시간이 걸렸다.
 |
| 동영상 편집 중. 스틸 사진을 모아 쿠키 영상 비슷한 것을 만드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여러 이미지 사이의 디졸브를 매끄럽게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
보컬을 담당하는 멤버가 무려 세 명이라는 것도 KRIBBtonite의 강점이다. 음향 장비를 더욱 확충하여 다양한 여건에서 좋은 사운드를 내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이다. 아울러서 재능과 끼를 갖춘 멤버가 더 모이면 좋을 것이다.
다음날,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한국유전체학회 동계심포지엄을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
| 중간에 들른 남한강 휴게소. |
 |
| 홍천에 왔으니 막국수를! |
첫 날에는 90분에 걸친 K-BDS(국가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세션에서 좌장을, 둘째 날(오늘)은 오전에 열린 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세션에서 발표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단지 15분에 불과한 발표이지만 대규모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인데다가 과제 책임자인 나는 세부적인 사항을 아주 상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연습을 많이 했다. 큰 발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분의 의자를 가져다 놓아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 사업단에서도 준비에 많은 정성을 쏟은 흔적이 역력했다. 사업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밴드 단톡방에 놀라운 소식이 올라왔다. 인트라넷 로그인 화면에 동영상 링크가 올라온 것이다. 연구소 공식 채널이 아니라 내 개인 채널이라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덕분에 조회수는 올라가겠지만... KRIBBtonite 로고는 챗GTP를 이용하여 내가 만든 것이다.
질의 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 100명 정도의 whole-genome sequencing 결과를 갖고 있는데 이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기탁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백롱민 사업단장의 답변을 기억나는대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참여자로부터 데이터에 대한 기부를 받는 동의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연구에서는 참여자로부터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지 기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본 사업에 기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기존 데이터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틀 안에 넣으려면, 참여자를 다시 수소문하여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다소 어려운 말로는 '동의서 구득'이라고 한다. 이는 인간 대상 연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규제 현실에서 빚어지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몇 가지 방법으로 비식별 처리가 이루어진 인체유래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의서나 심지어 IRB 심의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내가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일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식별 정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익명화를 해야 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익명화보다 수준이 낮은 가명처리를 한 경우 이를 특정 목적-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에 한하여 정보주체(제공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엄격히 말해서 여기에 '연구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한다는 동의서까지 같이 받는 것이다. 데이터를 등록하는 은행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를 인체유래물은행이 담당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엄보영 사무국장의 사업 전체 설명에서 data philanthropy('데이터 자선 활동' - 기업, 기관 및 개인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기부 형태)를 강조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부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는 결국 동의서 구득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나에게는 미국의 모델이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같은 세션에서 발표를 했던 Graeme Bethel 및 일루미나 코리아의 관계자들과 미팅까지 하느라 늦은 점심을 먹어야 했다. 왜 genome sequencing이 필요한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과학자들에게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며, 마지막으로 제약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Bethel의 말이었다.
 |
| Graeme Nethel의 발표. |
오후 세시 반이 다 되어서 홍천을 떠나 대전으로 향했다. 또 눈이 내린다! 영하 18도에 가까운 혹독한 강원도의 밤을 보낸 때문일까,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도 되었으니 주말에는 서비스 센터에 가 봐야 되겠다. 지난주의 여수 여행과 서울 나들이를 비록하여 공연,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강원도 출장까지... 나나 자동차나 모두 수고가 많았다. LibreCAD에서 진공관 앰프 상판 도면을 완성하는 것도 이번 주말의 숙제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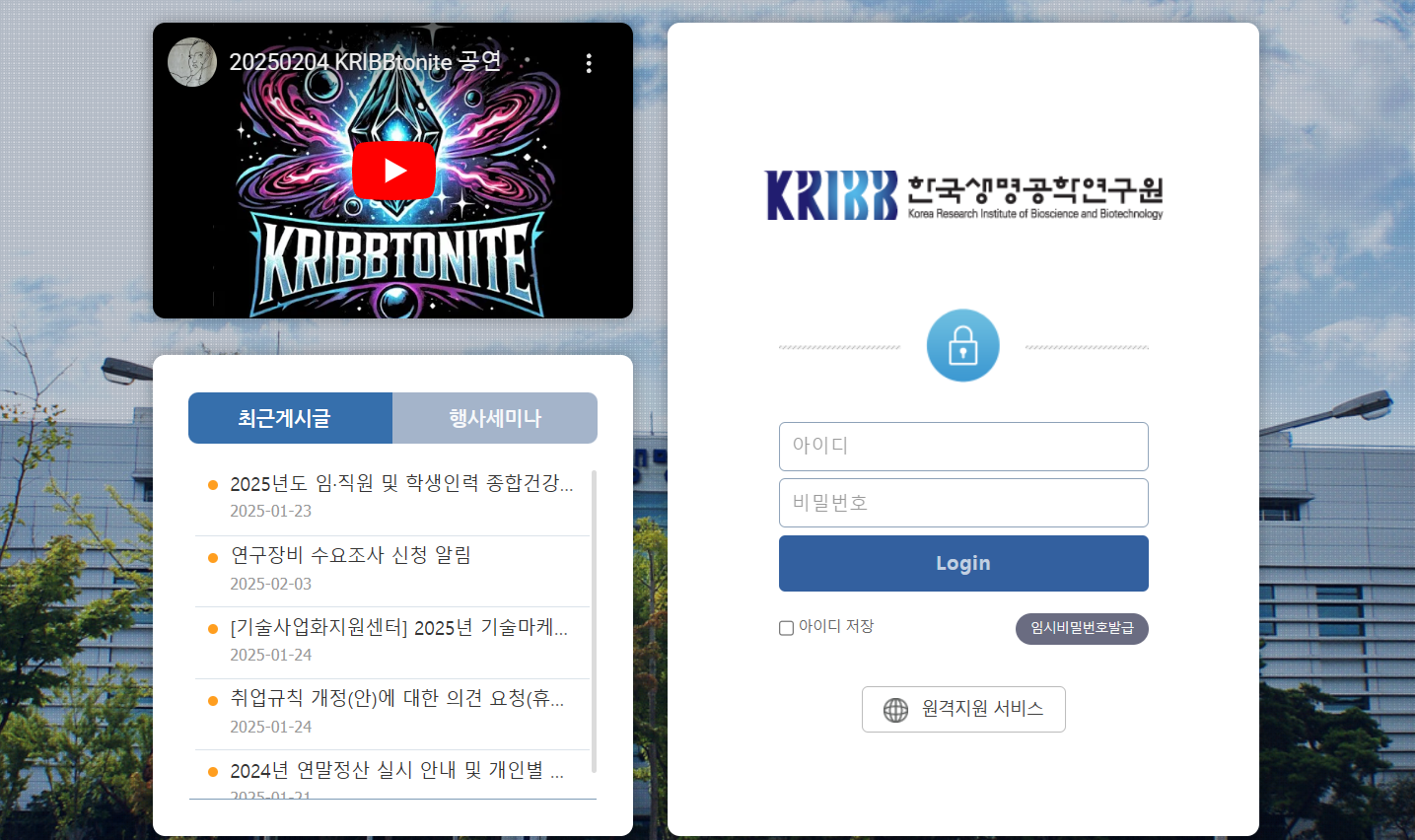
댓글 없음:
댓글 쓰기